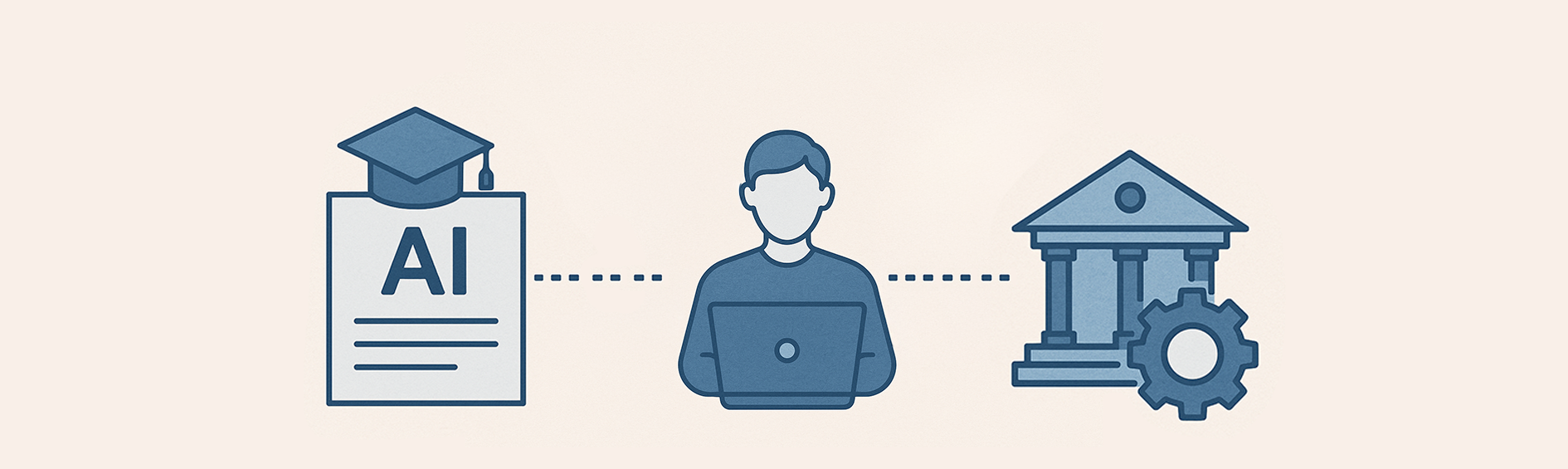‘새 박사’로 알려진 윤무부(생물학) 전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경희의료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새 박사
향년 84세로 영면하다
윤 전 명예교수와 우리학교의 인연은 1960년, 생물학과 학부생 입학과 함께 시작됐다.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생물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물교육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한국에 사는 휘파람새 소리의 지리적 변이’를 썼다.
1979년, 모교로 돌아온 그는 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해 27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다. 고인과 14년 동안 함께 근무한 이기태(생물학) 명예교수는 “윤 교수님은 활발한 외부 활동을 통한 인지도를 활용해 제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전개한 분”이라며 “평소에도 모든 일에 열정을 보이며 학과에 애정을 보이셨다”고 회상했다.
2002년 1월부터는 약 1년간 우리학교 자연사박물관장을 역임했고, 2006년 퇴임 이후에는 2014년까지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인의 두 자녀 모두 우리학교를 졸업했고, 아들 윤종민(생물학 1993) 씨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현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위 또한 동문으로, 2019년에는 온 가족이 경희가족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학교 밖에서도 KBS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서 조류 해설위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저서로도 새 지식을 널리 알렸다. 1990년『한국의 철새』, 2002년『한국의 습지, 세계의 새』, 2004년 아들과 함께 쓴『새 박사, 새를 잡다』를 집필했다. 이렇게 새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환경우수상, 1999년 자랑스런 서울시민 500인 상, 2011년 자랑스러운 경희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윤 교수의 새 사랑은 누구보다도 대단했다. 그의 동료 정용석 교수는 “윤 교수님이 무수한 현장 연구를 통해 쌓은 경험적 깊이는 누구보다 뛰어났던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사진=윤종민 씨 제공)
누구보다 대단했던 탐조활동
아찔했던 순간도 여럿
조류학자로서 그의 새 사랑은 누구보다 대단했다. 아들 윤 씨는 “아버지는 가족보다 자연을 더 사랑하신 분”이라며 “가족 1년 일정은 아버지 탐조 활동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새들의 번식이 시작할 때면 둥지를 찾으러 다니고, 봄·가을에는 철새, 겨울에는 월동하는 새 관찰의 반복이었다. 이어 “아버지를 따라, 그곳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식지가 없어지진 않는지 보면서 컸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고인과 11년간 함께 강의한 정용석(미생물학) 생물학과 교수는 “윤 교수님이 무수한 현장 연구를 통해 쌓은 경험적 깊이는 누구보다 뛰어났던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탐조 활동이 늘 순탄하지는 않았다. 1967년 광릉수목원(현 국립수목원)에서 폭우에 휩쓸렸다가 구사일생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 집중호우는 광릉 부근에서만 주민 90명이 익사할 정도의 대형 사고였다. 그는 개울에서 미끄러져 6시간을 떠내려갔고, 시신 12구와 함께 발견됐다. 아들 윤 씨는 “아버지와 광릉으로 탐조 활동을 자주 갔는데, 광릉 가는 길이면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회상했다.
위장옷을 입고, 숨어서 사진을 찍으며 탐조 활동을 하다 간첩으로 오해받은 적도 많았다. 잦은 심문과 신고를 받아 지친 그는 편법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검문소를 피해 몰래 촬영하고, 주민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약초 장수라고 거짓말할 만큼 새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엄청났다.
2006년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탐조 활동을 하다 뇌경색이 오기도 했다. 병원에 너무 늦게 와 가족들에게 장례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오른손이 마비됐다. 그래도 그의 새 사랑을 막을 순 없었다. 휠체어에 카메라를 고정해 왼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개조했다. 휠체어를 타고도 중랑천에 새 관찰을 하러 갔던 그는 2024년 원앙 200마리 집단 출몰을 성동구청에 알릴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 윤 교수가 표본박제한 황새로,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사진=오승현 기자)
새가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다
윤 전 명예교수는 늘 새의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곤 했다. 아들 윤 씨는 “아버지는 생전 ‘새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슬로건처럼 하셨다”며 “아버지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했던 말이나 글이 일반인들에게 체내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새는 아무 데나 둥지를 틀지 않는다’라는 말도 좋아했다. 그 말대로 생전 자신이 영원히 머물 둥지를 찾아 오래전부터 가족 묘를 만들어놨다.
아들 윤 씨는 “아버지가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원하시던 새 구경을 실컷 시켜드릴 것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정된 자원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유·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윤 명예교수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보였던 새에 대한 열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