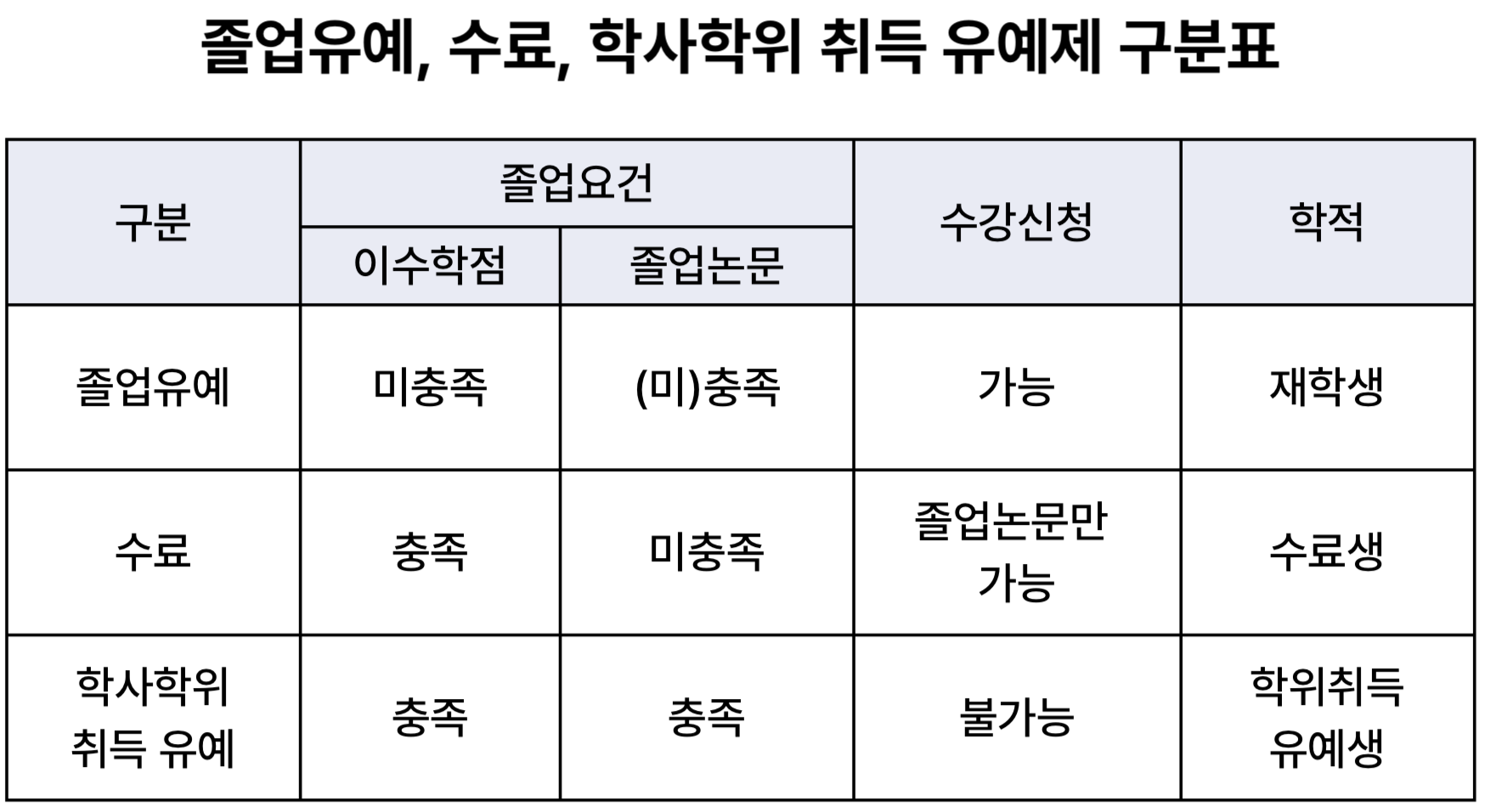“최근에 지원한 아르바이트 열 군데에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너무 많은 경쟁에 대해 생각했다. ‘금턴’이라고 불리는 인턴 채용 경쟁부터, 여러 자격증이 필수였던 공군 입대 경쟁도 떠올랐다. 경쟁에서 밀려나는 아픔보다 내게 더 씁쓸한 건 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우리의 태도다.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옆자리 친구를 눌러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기 때문일까, 우리나라는 경쟁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는 대학의 학생 평가 기준에 의문을 가지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대학의 목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으로서 대학에 몸담았던 내겐 생소한 문장이다.
적어도 내가 봤을 땐 ‘인격을 도야하고, 심오한 학술이론을 연구하는’ 학생보단 ‘좋은 학점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여유롭던 중앙도서관에 자리가 부족해진다. 그때만 갑자기 모여 똑같은 강의자료를 암기하고 똑같은 시험을 통해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뉘는 우리의 모습은 독서실 다니던 중고등학생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한다.
과거에 대학은 속세에서 살짝 벗어나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상아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대학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대학 입시 경쟁에 지쳤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 경쟁을 피할 수 없을 우리가 잠깐 경쟁에서 벗어날 곳은 대학 뿐이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짧은 시간조차 경쟁에 허덕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화 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10년,20년 뒤 대학의 가치는 더욱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쟁만이 남은 사회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때다.
- 1
- 2
- 3
- 4
- 5